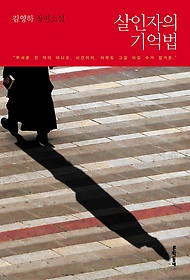Contents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력이 많은 작가임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영화로도 나와 읽어보게 되었다. 얇은 책인데 후루룩 빠져들게 만들었다. 등교하는 복잡한 지하철 1호선에서 다 읽어지게 될 만큼 빠르게 읽어졌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70세 은퇴한 연쇄살인범 김병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이라는 설정부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금방 소설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깔끔하고 절제된 문장과 이야기의 힘이 대단하다. 문체는 거칠고 남성적이였지만 거부감은 없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외로움, 수치심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타인과 함께있는 것조차 불편해한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서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알게되고 또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 생각했기에 행동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살인이라는 행위에 몰입했다. 더 잘하기 위해, 자신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더 열심히 몰입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없다. 악과 선에 대한 경계도 없다. 아마 자신이 두려워 했던 것은 이런 기억의 상실이었을 뿐이였을 것이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애완견의 이름을 자꾸 잊게 된다. 방금 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생각나지 않는다. 낯선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고 낯선 곳에 서 있다. 비눗방울을 잡을려고 애써보지만 손에 닿으면 터지듯이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다. 잊어간다. 잊혀져간다.
흐르는 세월 속에 부질없는 인간의 욕망이 일으킨 사건이다.
무서운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