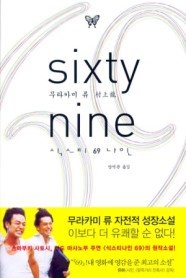Contents
1969년 미국은 히피문화가 꽃 피웠고 인류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걸었으며, 우드스톡 페스티벌과 예스, 딥퍼플, 비틀즈, 크림 등 이제는 전설로 남은 록 앨범들이 쏟아져나왔다. 2차 세계대전 이전 태어난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의 문화가 충돌한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책은 같은 시기의 일본의 풍경을 담고 있으며 글쓴이의 고등학고 때의 내용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이 책의 주변 상황은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주인공은 자신 나름의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해간다. 저자는 책에서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즐겁게 썻고 즐거운 책이니 즐겁게 읽어 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아직까지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다.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의 후기가 마음에 남는다. 후기는 아래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중략)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이다. 나는 고교시절 나에게 상처를 준 선생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소수의 예외적인 선생을 제외하고, 그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버렸다. 그들은 인간을 가축으로 개조하는 일을 질리지도 않게 열심히 수행하는 ‘지겨움’ 의 상징이었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어느 시대건, 권력의 앞잡이는 힘이 세다. 그들을 두들겨 패보아야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쪽이다. 유일한 복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 책의 주인공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싸움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겨운 사람들에게 나의 웃음 소리를 들려 주기 위한 그 싸움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