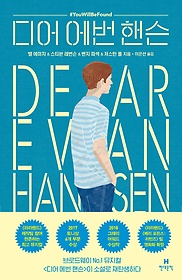Contents
영어권 지역에서 ‘미들 네임’은 존재만 할 뿐 그닥 쓰이지 않는다. 우스개 소리로 ‘미들 네임’의 여부로 상대가 화났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농담만으로도 미들 네임의 존재가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디어 에번 핸슨’의 주인공 에번 핸슨의 미들 네임은 ‘에번’이다. 에번에게는 ‘마크’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학기 초가 되면 찰나에 마크로 살아가다, 에번으로 돌아간다. ‘에번’은 그의 삶의 모양새와 닮았다.
그는 그럴 듯하게 살아간다. 상담의 일환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쓰며, 내일은 괜찮아지리라 암시를 건다. 그러나 찾아오는 건 오늘 뿐, 괜찮은 내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의 ‘암시’는 거짓말이 된다. 바닥에 눌러붙은 껌처럼 달라붙은 거짓 암시는, 코너의 죽음과 엮이면서 그의 삶 빈 부분을 채워넣게 된다. 어느새 에번 핸슨은 그럴 듯한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죄책감과 괴로움을 오가게 만들었다.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다. 가면을 뜻하는 이 말은 작품 속에서 작가의 얼굴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를 일컫는 말이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의 얼굴에도 달라붙어 있다. 낯선 이를 만났을 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심지어 친구와 가족에게 조차 가면 속에 숨겨진 우리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 자신에게 만큼은 가면이 없는 내 모습이 보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내 앞에서조차 달음박질을 치는지, 가면을 쓴 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마치 맞지 않는 거푸집에 녹은 철을 흘려 보내는 기분이다. 컵 모양을 띠고 있는 칼을 상상한다면, 쓸모도 없을 뿐더러 무엇에 써야할지 모를 테다.
발가벗은 내 모습은 부끄럽다. 대단한 척하고 살아도, 결국 시퍼런 알몸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없는 ‘메’일 뿐이다. ‘메’라는 말은 에번 핸슨을 지칭하는 의성어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알몸 또한 메이기에.
에번 핸슨은 결국 메를 받아 들인다. 자신을 메운 거짓된 암시의 여파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코너의 부모님의 사랑을 포기해야 했고, 코너의 동생과 헤어졌으며 엘레나에게는 멸시를 받았다. 쌓아올린 것에 대한 아픔이 절벽을 깍는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그러나 에번은 더 이상 죄책감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을 벗어냈기 때문이다. 오늘이 두려워 바둥거리다 마침내 내일을 맞은 것이다.
내 모습에 대한 고민, 두려움… 누구나 가슴 한 켠에 쥐고 살아가는 문제일 테다. ‘메’가 되기 싫어서, 삶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고, 타인도 타인이다. 결국 각자에게 ‘메’이기에, 이 모습을 벗을 순 없다.
살면서 몇 번이고 가면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는 ‘메’인 모습을 품고 또 사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