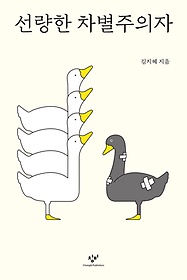선량한 차별주의자
서평내용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속에 녹아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다.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 생각들에 차별이, 혐오가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책이다.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장애라는 단어가 이 책에 등장하였을 때 나는 너무 놀랐었다. ‘선택장애’ 이 단어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우리는 차별표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선택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럼없이 자신 또는 타인들은 쉽게 이 단어를 입에 담고 내뱉는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 우리가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우리가 칭찬이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차별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책에서는 우리가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차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속의 부당함을 제대로 대면하고 외치는가? 아니면 그 문제의 피해자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독자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의문들이 생겼을때 그저 의문으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의문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돕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차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의 행동, 언어들을 돌아보며 차별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책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모르고 한 차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방어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자기 성찰로 반성하자 한다. 이러한 조그마한 시도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은 조금씩 차별을 인식하고 고쳐나가게 되면 차별하는 사람도 차별받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생각과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성착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