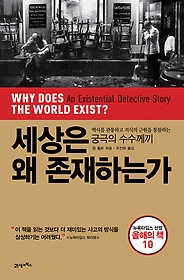서평내용
이야기는 태초의 시점에 대한 질문들로 시작하고 있다.
왜 세상은 존재하는가.
세상의 시작 직전에 우주는 ‘무’라는 상태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무’는 무엇인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신의 창조는 설명할 수 있는가
다중우주
힉스입자
인과론
논리학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수 많은 물리, 수학자들과 사상가들 심지어 고대의 철학자들까지.
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인류가 창조를 설명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반대로 위대해 보였고 다시금 바라보면 초라하게 다가왔다.
과거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없는 시공간에서라도 ‘무’를 고민하는 자아가 있기때문에 ‘무’란 생각할 수 없다, 혹은 사막유목민족의 창조주로 부터 시작되었다 등의 독자인 본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여러 견해들을 보았다.
이 책은 굉장히 어려웠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조각조각 인용하여 ‘무’ 어쩌면 ‘영원’을 설명해보려 하지만 역부족인 듯 하다. 슬프게도 난 그마저도 녹여들이지 못했다.
사제와 물리학자, 승려의 대담을 인용하며 책은 마무리 된다.
신성에 의한, 혹은 순전히 우연에 의한 시작. 마지막으로 시작은 없었다는 주장.
당장은 시작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더라도 ‘근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실체의 본성을 탐구하고 싶다’는 승려의 말이 와 닿았다.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이를 찾아가는 과정은 ‘무’가 아니다.
지구가 우주의 티끌정도라고 이해되는 현대에 와서까지 알 수 없는 ‘실존’들의 이유를 신에게서 찾는 비겁함은 여전한듯하다. 물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수 많은 선각자들이 고민했던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반드시 ‘자아’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이 십 수년간 살이나 찌우면서 살았던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