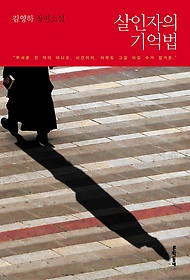서평내용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다 살인자라니! 뉴스에서나 흔하게 보던 연쇄살인범들이 과연 어떤 기억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끔 만들게한다. 소설, 특히 요즈음에 출판되는 것들을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김영하의 신작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매스컴을 타고 추천도서로 선정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니 김영하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내용이 어떻길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소설을 빌리는 경우가 항상 그렇듯 아무 부담없이 줄줄 읽을 수준의 것으로 빌려 읽었다.
처음부터 살짝 놀랬던 것은 아무 단락도, 시점의 전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의 진행이 특이하다는 것. 나중에 가서야 주인공이 가진 알츠하이머라는 병의 특성을 이런 방식으로 더 적나라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장치라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진행방식만으로 일반적인 소설의 포맷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이런 독특한 스타일의 문체덕분인지 스토리에 진입해서 클라이막스를 넘어 사건이 끝나는 시점까지 순식간에 지나가겠끔 만들어준다. 물론 책에 담겨진 내용자체가 적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문장들로 사건을 전개해나가고 읽는 이를 몰입하게 만들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필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다보면 예상을 벗어나는 사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일어난 연쇄살인의 잠정적 범인이며 주인공의 딸을 노리는 박주태와 과거의 연쇄살인범이며 현재 알츠하이머를 겪으나 딸을 지켜주려는 김병수 그리고 그의 딸 은희 이렇게 세 명의 인물사이에서 벌어지는 묘한 심리적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최근의 연쇄살인의 범인과 궁극적으로 딸을 죽인 인물이 자기 자신, 즉 김병수라는 사실이 들어나는 시점이다. 이제까지 급박하게 그리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듯이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였던거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충격에 휩싸여 당황하고 있을 때 이야기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이야기 전개에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이야기가 끝이 나있는 것을 깨닫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일반적으로 어느 소설을 읽고 나서 가볍게 내용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의 차원을 넘어 아예 책의 내용자체를 독자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추리하게 만들어준다. 도대체 은희라는 존재에게 가지고 있던 김병수의 부성애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안형사의 존재는 무엇인지 등 어느 하나의 것도 쉽사리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병수가 다시 연쇄살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해가 간다. 초반부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서 친절히 알려주었듯이 알츠하이머라는 병 자체의 특성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일들부터 사라지는 뇌질환의 일종이니 과거의 행위들이 현재에 이르러 다시금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은희와 안형사의 존재 또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책의 뒷부분에 적힌 평론가의 철학적요소가 가미된 해석에 비하면 지극히 수수한 풀이겠지만, 이게 더 가볍게 읽는 소설에 적합한 해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다.
사실 기분이 꺼림칙한 것이 청량감?이 없다는 느낌이 강해서 이런 형식의 소설은 나에게 그리 쉽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같다. 그래도 파괴력있는 소설을 간만에 접하니 이런 맛에 소설을 읽는가 싶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책의 내용보다도 작가의 글에 담긴 짧은 단락의 글이 나에게 더 와닿았었는데, 벌이도 없이 습작으로 생활하던 저자가 어지러운 책상을 보며 투덜된 것을 들은 아버지가 매일 같이 책상을 치워주셨다는 미담,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소설의 내용보다 나에게 더 각인이 된 것을 보면, 결국 독자에게 와닿는 건 어렵고 난해한게 꼬아놓은 이야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미담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