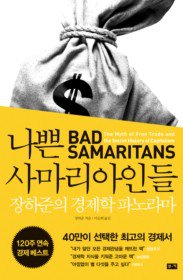서평내용
자유 무역은 좋은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달면 그는 이단이다. 신자유주의 학파의 핵심 이론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문을 열어왔고, 실제로도 엄청난 수준의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지난 15년간 자유무역협정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개발도상국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관세 수입의 감소로 인한 빈국의 재정압박은 반드시 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장기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급속하고, 무계획적이며, 포괄적인 무역 자유화의 결과였던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무역 자유화에 훨씬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국제 경쟁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에 가까운 자유 무역을 함을 강조하지만 그들 역시 부모가 있었기에 자라난 아이와 같다. 자유 무역은 단기간에는 소비의 극대화로 인해 최상의 무역이 될지 몰라도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은 되지 못한다.
경제발전은 선진 기술의 습득 및 숙달과 관련이 있다. 6.25 동란 이후 선진적인 외국 기술을 받아들인 한국과 기술의 자급자족을 꿈꿨던 북한의 대조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 기술의 습득은 외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외화는 수출을 통해 벌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은 곧 경제발전이다. 하지만 그 무역이 반드시 자유무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자유무역을 해야만 국제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의 성공비결은 유치산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후 보호와 개방 무역 정책을 혼합한 데에 있다. 이것은 별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대다수 부자 나라들이 해왔던 방법이다. 경제 발전에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 자유 무역은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 정책을 꾸준히 사용해야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